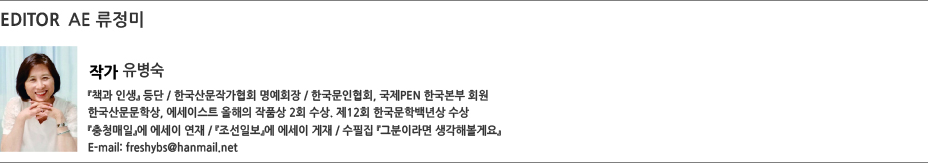커뮤니티

[수필] 손맛을 느끼다
2023-06-14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손맛을 느끼다
'글. 유병숙'
일기예보는 4~5m의 풍랑 예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아침 내내 바다의 표정을 살폈다. 예보가 무색하게 바다는 잔잔했다.
아들과 함께 낚시에 나섰다. 차가운 날씨가 코끝을 찡하게 했다. 오전 11시, 열 명을 태운 통통배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뱃전에 물보라가 일었다. 중앙부의 굴뚝에서 역한 기름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멀리 낙산사의 해수관음상,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왔다. 점점 멀어져 가는 도심을 바라보았다. 내가 두고 온 육지가 마치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았다.
얼마를 갔을까? 선장이 가자미 스폿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배가 멈추자 뱃전이 울렁댔다. 잠잠하던 갑판이 부산스러워졌다.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선장이 가자미 낚싯법을 설명하였다. 어종에 따라 낚싯대의 모양이 다르단다. 가자미 낚싯대는 끝이 옷걸이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무거운 추가 달렸고, 양 끝에 낚싯바늘이 늘어져 있었다. 여기에 미끼를 달면 되었다. 선장은 갯지렁이를 바늘에 끼우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바늘과 갯지렁이를 키스시킨 후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그의 말에 따라 꿈틀거리는 갯지렁이를 집어들었다. 갯지렁이는 바늘을 갖다대기 무섭게 피부터 뿜어내었다. 쩔쩔매는 나를 보자 아들이 얼른 미끼를 끼워주었다. 아들과 선장은 안면이 있었다. 선장은 “어머니, 오셨어요?” 하더니 “어머니 스스로 해 보셔요. 어렵지 않아요.” 하며 눈을 찡긋했다.

사실 나는 물고기에는 욕심이 없었다.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마음을 비워내고 싶은 마음에 아들을 따라왔다. 하지만 이 멀리까지 와서 소득이 없으면 뱃삯을 내 준 아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 같았다. 그새 물고기를 건져 올린 낚시꾼의 환호가 이목을 끌었다. 펄떡이는 물고기를 보자 불끈 욕구가 치솟았다.
“가자미는 주로 바다 밑바닥에 살고 있어요. 가운데 달린 추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리셔요. 툭툭 추가 닿는 느낌이 오지요? 줄을 당겨보셔요. 팽팽해지지요? 그럼, 준비 끝! 한 번씩 낚싯대를 끄떡끄떡해주고, 당겨주고….” 바닥에 흙탕물이 일어나면 가자미가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든단다. 시력이 좋지 않은 가자미는 갯지렁이 냄새를 맡고 미끼를 문다고 했다. 낚싯대에 느낌이 감지되면 얼른 릴을 감으면 되었다. 가느다란 낚싯줄을 통해 깊은 바다와 소통한다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바다 밑 사정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도 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큰 놈을 잡으면 목청이 더 커졌다. 작은 놈들은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나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선장이 다가와서 릴을 빼앗았다. 그는 부지런히 줄을 감았다. 또 뭔가 지청구를 듣겠구나 하고 있는데 아이코, 양쪽에 두 마리가 걸려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멍때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드디어 잡았다는 기쁨도 잠시 그 짜릿하다는 손맛을 놓친 게 안타까웠다. 선장은 미끼를 끼워주며 “어머니, 오늘 수업료 두 배로 내세요.” 하며 옆에 서 있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다.

아들이 낚싯대를 끌어 올리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절로 환호성이 터졌다. 커다란 도다리가 문 것이다. 선장과 낚시꾼들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댔다. 어찌나 힘이 좋은지 녀석이 푸드덕거리는 서슬에 잡아놓았던 가자미들이 물통 밖으로 튀어 나갔다. 마치 내가 잡은 듯 어깨가 쑥 올라갔다. 아들은 이 맛에 시간만 나면 바다로 달려가는가 보다. 낚싯대를 드리우고 묵묵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간 켜켜이 쌓였던 스트레스가 스르르 풀린다고 했다. 몇 날 밤을 새웠던 작업이 끝나면 아들은 영락없이 낚시터로 달려가곤 했다. 물고기를 건져 올리며 어쩌면 삶의 생동감을 찾아내는 건 아닐까? 아들의 함빡 웃는 모습에 가슴 한켠이 짠해졌다.
한 번은 아래로 쏠리는 듯한 묵직한 감이 느껴져 감아올렸더니 미끼만 쏙 빼먹었다. 나에겐 미끼를 끼는 게 큰 숙제였다. 좌우로 흔들리는 배에서 조그만 바늘에 미끼 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잡아올린 후 물고기 입에서 바늘을 빼내는 일은 더 어려웠다. 미끼를 문 녀석들을 끌어올릴 때마다 에구 어쩌자고 물었노? 안쓰러움이 밀려왔다. 그렇다고 빈 낚싯대가 반가운 건 아니었다.
나는 일곱 마리를 잡았다. 손맛이 느껴지자 은근히 신바람이 올라왔다. 서둘러 미끼를 갈아 끼우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치받혔다. 얼른 봉지를 찾아 붙잡고 토하기 시작했다. 순간 일어난 일에 놀랐다. 선장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 게워내니 시원하지요? 아침에 시원찮은 거 드셨으면 그냥 다 토해내라며 웃었다. 땅에 발이 닿으면 멀미 증상은 사라진단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낚싯대를 놓았다.
검은 구름이 한층 두꺼워졌다. 물색도 덩달아 검어졌다. 후드득 빗줄기가 떨어지더니 바다가 너울거렸다. 시시각각으로 날씨는 예보를 따라가고 있었다. 선장은 태연했다. 괜찮아요. 한 30분 남았는데…. 모두 동의하시면 돌아갈게요 한다. 비에 아랑곳없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궂은 날씨도 아들의 낚시 삼매경을 막을 수는 없어 보였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폭우로 변했다. 선장이 뱃머리를 돌렸다.
뱃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닷속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비와 바람이 사정없이 바다를 두들겨댔다. 사방에서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출렁이는 바다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였다.
아들과 함께 낚시에 나섰다. 차가운 날씨가 코끝을 찡하게 했다. 오전 11시, 열 명을 태운 통통배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뱃전에 물보라가 일었다. 중앙부의 굴뚝에서 역한 기름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멀리 낙산사의 해수관음상,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왔다. 점점 멀어져 가는 도심을 바라보았다. 내가 두고 온 육지가 마치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았다.
얼마를 갔을까? 선장이 가자미 스폿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배가 멈추자 뱃전이 울렁댔다. 잠잠하던 갑판이 부산스러워졌다.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선장이 가자미 낚싯법을 설명하였다. 어종에 따라 낚싯대의 모양이 다르단다. 가자미 낚싯대는 끝이 옷걸이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무거운 추가 달렸고, 양 끝에 낚싯바늘이 늘어져 있었다. 여기에 미끼를 달면 되었다. 선장은 갯지렁이를 바늘에 끼우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바늘과 갯지렁이를 키스시킨 후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그의 말에 따라 꿈틀거리는 갯지렁이를 집어들었다. 갯지렁이는 바늘을 갖다대기 무섭게 피부터 뿜어내었다. 쩔쩔매는 나를 보자 아들이 얼른 미끼를 끼워주었다. 아들과 선장은 안면이 있었다. 선장은 “어머니, 오셨어요?” 하더니 “어머니 스스로 해 보셔요. 어렵지 않아요.” 하며 눈을 찡긋했다.

사실 나는 물고기에는 욕심이 없었다.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마음을 비워내고 싶은 마음에 아들을 따라왔다. 하지만 이 멀리까지 와서 소득이 없으면 뱃삯을 내 준 아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 같았다. 그새 물고기를 건져 올린 낚시꾼의 환호가 이목을 끌었다. 펄떡이는 물고기를 보자 불끈 욕구가 치솟았다.
“가자미는 주로 바다 밑바닥에 살고 있어요. 가운데 달린 추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리셔요. 툭툭 추가 닿는 느낌이 오지요? 줄을 당겨보셔요. 팽팽해지지요? 그럼, 준비 끝! 한 번씩 낚싯대를 끄떡끄떡해주고, 당겨주고….” 바닥에 흙탕물이 일어나면 가자미가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든단다. 시력이 좋지 않은 가자미는 갯지렁이 냄새를 맡고 미끼를 문다고 했다. 낚싯대에 느낌이 감지되면 얼른 릴을 감으면 되었다. 가느다란 낚싯줄을 통해 깊은 바다와 소통한다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바다 밑 사정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도 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큰 놈을 잡으면 목청이 더 커졌다. 작은 놈들은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나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선장이 다가와서 릴을 빼앗았다. 그는 부지런히 줄을 감았다. 또 뭔가 지청구를 듣겠구나 하고 있는데 아이코, 양쪽에 두 마리가 걸려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멍때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드디어 잡았다는 기쁨도 잠시 그 짜릿하다는 손맛을 놓친 게 안타까웠다. 선장은 미끼를 끼워주며 “어머니, 오늘 수업료 두 배로 내세요.” 하며 옆에 서 있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다.

아들이 낚싯대를 끌어 올리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절로 환호성이 터졌다. 커다란 도다리가 문 것이다. 선장과 낚시꾼들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댔다. 어찌나 힘이 좋은지 녀석이 푸드덕거리는 서슬에 잡아놓았던 가자미들이 물통 밖으로 튀어 나갔다. 마치 내가 잡은 듯 어깨가 쑥 올라갔다. 아들은 이 맛에 시간만 나면 바다로 달려가는가 보다. 낚싯대를 드리우고 묵묵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간 켜켜이 쌓였던 스트레스가 스르르 풀린다고 했다. 몇 날 밤을 새웠던 작업이 끝나면 아들은 영락없이 낚시터로 달려가곤 했다. 물고기를 건져 올리며 어쩌면 삶의 생동감을 찾아내는 건 아닐까? 아들의 함빡 웃는 모습에 가슴 한켠이 짠해졌다.
한 번은 아래로 쏠리는 듯한 묵직한 감이 느껴져 감아올렸더니 미끼만 쏙 빼먹었다. 나에겐 미끼를 끼는 게 큰 숙제였다. 좌우로 흔들리는 배에서 조그만 바늘에 미끼 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잡아올린 후 물고기 입에서 바늘을 빼내는 일은 더 어려웠다. 미끼를 문 녀석들을 끌어올릴 때마다 에구 어쩌자고 물었노? 안쓰러움이 밀려왔다. 그렇다고 빈 낚싯대가 반가운 건 아니었다.
나는 일곱 마리를 잡았다. 손맛이 느껴지자 은근히 신바람이 올라왔다. 서둘러 미끼를 갈아 끼우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치받혔다. 얼른 봉지를 찾아 붙잡고 토하기 시작했다. 순간 일어난 일에 놀랐다. 선장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 게워내니 시원하지요? 아침에 시원찮은 거 드셨으면 그냥 다 토해내라며 웃었다. 땅에 발이 닿으면 멀미 증상은 사라진단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낚싯대를 놓았다.
검은 구름이 한층 두꺼워졌다. 물색도 덩달아 검어졌다. 후드득 빗줄기가 떨어지더니 바다가 너울거렸다. 시시각각으로 날씨는 예보를 따라가고 있었다. 선장은 태연했다. 괜찮아요. 한 30분 남았는데…. 모두 동의하시면 돌아갈게요 한다. 비에 아랑곳없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궂은 날씨도 아들의 낚시 삼매경을 막을 수는 없어 보였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폭우로 변했다. 선장이 뱃머리를 돌렸다.
뱃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닷속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비와 바람이 사정없이 바다를 두들겨댔다. 사방에서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출렁이는 바다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였다.